MOST beautiful THINGS NOW
눈부신 초여름을 맞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유무형의 아름다움들을 그러모았다.
BY 에디터 장은지, 송혜민, 전수연, 김화연, 최윤정 | 2024.07.02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기필코 우리의 시야 내에 존재한다. 다만 우리의 눈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에 나오는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런던에 사는 따분한 중년 남성이다. 그는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가족을 버리고 돌연 프랑스 파리로 가 화가가 된다. 파리에서 그는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던 친구의 아내와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한 가족을 파멸시킨다. 결국 스트릭랜드는 원시적인 타히티 섬으로 이주하는게 되는데, 나병에 걸려 몸은 비록 썩어 문드러져 갔지만 그의 예술혼만은 극점에 이른다. <달과 6펜스>는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이다. 스트릭랜드가 썩어가는 몸으로 그린 벽화를 보고 닥터 쿠트라는 이렇게 목격담을 전한다. “창세의 순간을 목격할 때 느낄 법한 기쁨과 외경을 느꼈다.” “무섭고도 관능적이고 열정적인 것, 그러면서도 공포스러운 어떤 것이 있었다.”
그의 죄와 썩은 몸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절박한 붓끝으로 완성한 그의 예술만은 아름답다. 안정적인 삶을 내던지고 예술을 좇아간 용기는 아름답지만 도덕이나 통념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이렇듯 <달과 6펜스>는 아름다움의 정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은 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과연 아름다움일까? 그것은 온당한 아름다움일까? 그런데 아름다움이 꼭 도덕적으로 무결한 것이어야만 할까? 아름다움은 닿지 못할 때만 급기야 아름다움으로 수호되는 걸까, 실은 그것을 좇다 스스로를 잃고 타락하는 것까지가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의 완성일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속 영원한 아름다움을 좇는 도리언 그레이의 병든 이면은 아름답지 않지만 퇴폐적이고 매혹적이다. 스트릭랜드의 벽화를 본 닥터 쿠트라 역시 비슷한 감상을 말한다. “거기에는 원시적인 무엇, 무서운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음란했다.”
<달과 6펜스>에서 달은 ‘이상’, 6펜스는 ‘현실’로 치환할 수 있다. 여기서 ‘달’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이 곧 달은 아니다. ‘6펜스’는 아름다움이 아니지만 6펜스에 아름다움이 깃들 수는 있다. 아름다움은 세계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바로 세웠지만 동시에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기도 한다. 인류는 오랜 시간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해왔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로 대변되는 원시미술부터 중세의 고딕 양식을 지나 낭만주의, 인상파, 큐비즘, 다다이즘 그리고 오늘날 개념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의 연대기는 필연적으로 전대의 미 개념을 관철시키고 또 반발하면서 모습을 바꿔왔다. 빛의 예술가 르누아르는 “고통은 순간,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고 근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름다움은 여름철의 과실과도 같아 썩기 쉽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다. 영국의 시인 존 키츠는 “아름다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라 했고, 스코틀랜드 작가 조지 맥도널드는 “미와 슬픔은 언제나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한 치의 오점도 없는 백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요철(凹凸)이 가득한 토분을 아름답다고 여길 수도 있다. 누군가는 낮의 무해함과 찬란함을, 누군가는 밤의 파열을 더 매혹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군가는 형이상학적인 순수이성을, 누군가는 에로티시즘적 방종을 더 아름답게 여긴다. 누군가는 아름다움은 즐거운 것이라 하고 또 두려운 것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은 시공간을 분절하고 다시 잇는다. 아름다움은 비상하고 때론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파이프 그림을 두고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그리트적 혁명, 진짜 파이프를 연결해 ‘이건 파이프다’ 되받아친 뱅크시적 펑크. 서로 상충하는 모든 이념엔 그것대로 우러러볼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지만 한결같은 진실이 있다면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롭게 소멸하고 생성하고 변한다는 것. 어쩌면 아름다움은 그냥 변하는 것으로만 존재하거나 그저 가능 세계에 있거나 개념, 하물며 단어 그 자체만일 수도 있다. 질 들뢰즈는 “개념은 ‘벽돌’이다. 그것은 이성의 재판소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창문으로 던져질 수 있다”고 말했다. ‘Most Beautiful Things Now.’ 눈부신 초여름을 맞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유무형의 아름다움들을 그러모았다. 누군가에겐 창밖으로 던져진 벽돌처럼 덤덤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빛나는 이성을 축조하고 감성의 우물을 채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 믿는다.
MOST BEAUTIFUL
SUMMER FL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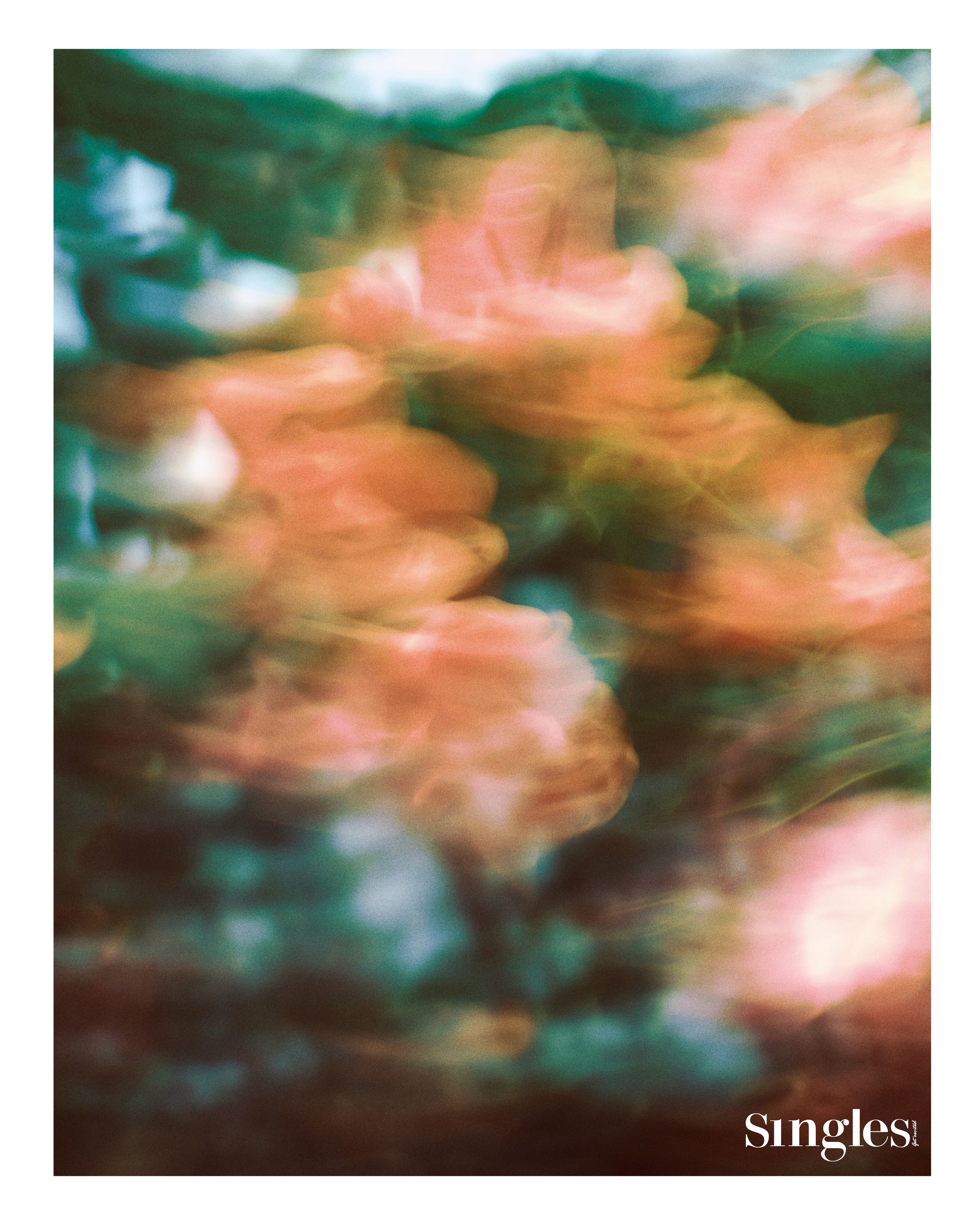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 아무리 녹아내릴 것 같은 더위에도 꼿꼿하게 붉은 꽃잎을 열어젖히는 꽃. 푹푹 찌는 폭염과 장마, 태풍과 불볕. 식물이 꽃을 피우기엔 혹한만큼이나 모진 시기에 능소화는 핀다. 능소화가 주렁주렁 만개하는 건 곧 완연한 여름이 왔다는 뜻과도 같다. 고아한 자태 뒤에 숨은 독한 마음. 그 숨은 뜻을 알고 나면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most beautiful
word

서체 디자이너 한동훈이 쓴 '아름다움'은 힘주지 않고 흘려보듯 흐른다. 연결과 비연결 속 그 틈을 서로가 생각하는 다름으로 채울 수 있도록.
사진
박종원, 류경윤, 박현구, 채대한, 배준성
라이프스타일
능소화


